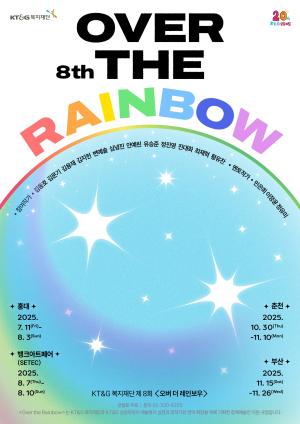[FA저널 SMART FACTORY 박규찬 기자] 국내 스마트공장 기술은 스마트공장의 핵심 요소기술인 생산설비, 센서, ERP, MES, CAD 등의 솔루션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의 기술에 종속돼 있는 상황이다. PLC 제품의 경우 LS산전과 같은 전문기업의 활동으로 약 30%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하이엔드 시장 점유율은 외국 기업의 공격적 시장 전략으로 인해 쉽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표준수립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 국가기술표준원 최동학 스마트공장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진=FA저널 SMART FACTORY] |
국가기술표준원 최동학 팀장은 스마트공장 도입시 기본적으로 표준화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회사의 업무부터 표준화를 해야 한다. 표준화를 나만하게 되면 내부 표준화가 되고 내부 규정이 된다. 나중에 외부와 연계가 되면 내부규정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끝나버린다.
스마트공장이란 전제하에서 왜 표준화가 돼야 하느냐. 사회전체가 글로벌 제품, 글로벌 생산, 글로벌 경영, 글로벌 컴퍼니라고 한다. 이 말은 즉, 나 혼자 못산다는 것이다. 스마트 공장이 나온 것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독일에서 먼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스마트공장이란 개념이다. 이는 스마트한 제품 사람, 프로세스가 포함돼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의 가장 큰 팩트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인데 이러한 것들은 초연결 사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연결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제품이 외부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연결 자체는 표준을 안고 가야한다. 무엇으로 연결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그 생산 자체를 표준화 할 것인지, 생산 자체를 표준화할 것인지, 업무를 표준화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다. 제품이 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세계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해야 한다.
효율적인 표준화를 위해서는 우선 연구-개발-생산 과정에서의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표준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생산단계에 들어가야 표준으로 만들 수가 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일하는 방식,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안 된다. 시제품이 나오고 양산에 들어가야 뭔가 기준이 나오고 품질 관리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표준이다.
즉, 제품을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단계가 와야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 그 프로세스를 따라 스킬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장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 반면 수시로 업무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표준을 할 필요가 없다.
이에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반복되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할 업무가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하고 있을 경우 그 업무부터 표준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내 표준을 먼저 해야 한다. 국가 표준 혹은 세계 표준이 있을 경우 그것을 사내 표준화해야 한다.


![[현장] 현대차 “아이오닉 6 N, 현대 N 브랜드 최초의 세단 타입 고성능 EV”](/news/thumbnail/202507/66956_76959_4846_v150.jpg)